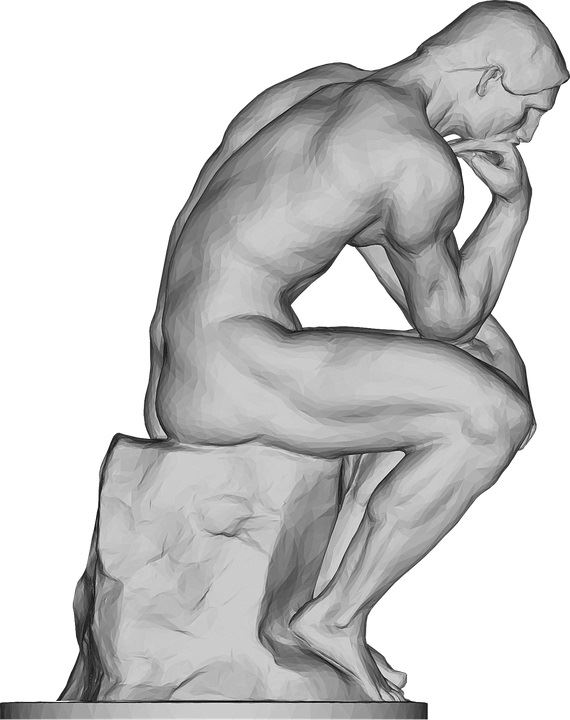 [픽사베이]
[픽사베이]
몸은 쾌락의 도구일까, 고통의 원천일까? 시골 지역에도 모텔이 참 많다. 숲속 그윽한 곳에 좀 괜찮다 싶은 건물은 영락없이 모텔이다. 대처에는 관심하여 세어보면 병원이 의외로 많다. 그 몇 배로 약국도 즐비하다.
몸과 고통은 정직하다. 그래서 공평하다. 화장실을 대신 가 줄 수 없고, 잠을 누가 대신 자 줄 수 없다. 고통도 마찬가지이다. 제 몸의 고통은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일단 자신의 몸에 칼을 대게 되면, 뇌물로 헐장(歇杖)을 맞을 수도 없고, 돈질로 매품을 살 수도 없다.
입원 사흘째 아침, 수술 준비에 몸을 맡겼다. 퍼머하고 난 뒤 아줌마들이 씀직한 위생모자로 머리칼을 감싸고, 이동용 침대에 누웠다. ‘드디어 수술을 하게 되는구나’ 실감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본, 수술대 위의 환자! 남의 일로만 여긴 그 장면의 주인공이 내 자신이라니. 좀은 긴장되었다.
척추마취 주사를 맞자 이내 까무룩 의식이 사라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지럽게나마 의식이 돌아왔다. 수술 부위인 무릎을 덮은 하얀 천을 치우는 등 수술실을 정리하는 간호사들이 눈에 들어왔다. 곧이어 이동용 침대로 옮겨지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5층 수술실에서 10층 회복실로 직행했다. 11시쯤으로 기억한다. 그러므로 수술에 걸린 시간은 대략 2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고통은 회복실에서 시작되었다. 마취나 진통제 덕분인지 몸의 고통은 감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고통이 끔찍했다. 아니, 고통이라기보다는 적확히는 ‘견디기 힘듦’이라고 해야 할까. 담당 간호사가 일렀다. “앞으로 6시간은 꼼짝 없이 딱 누워있어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고개를 들면 마취제가 ‘이러쿵 저러쿵’, 하여튼 큰일 납니다.”
현명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은 사람이라고들 한다. 현명하진 못하지만, 이 말을 체득한 지 오래다. 혼자 있음이 일상인 처지다. 더러 사람이 고프기도 하지만, 아무런 방해 없이 좋아하는 일에 오로지할 수 있다. 득이 실을 덮고도 남는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도 6시간이나.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비몽사몽 속을 오락가락했다. 억지로 잠을 청하는 의지는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했다. 벽걸이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아직 3시간이 남았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벨을 눌렀다. 간호사가 달려왔다. “내 병실 사물함에 가면, <미디어오늘>이라는 신문이 있을 것이요. 그것 좀 갖다 주게나.” 간호사는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수술 부작용이 의심돼 황급히 달려왔는데, 생뚱맞게 무슨 읽을거리를 갖다 달라니······. 아직 어지러울 건데 뭘 읽을 수 있겠어요, 하고 물었다. 설명할 기분도 아니고, 내 견디기 힘든 상황을 주절댈 여력도 없다. “People people left left.” 간호사는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생각했겠지. 어쨌건 환자가 원하니, 신문을 찾아다 갖다 주었다.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이 떠났다.’ 내 정신 상태는 온전하다. 온전하기에 이 무력한 상황을 견디기 힘들다. 이 못 견딤을 타파하고자 읽으려는 것이다.
회복실 상황에 맞춤한 준비는 아니었다. 예상도 못했다. 그러나 수술 후 몸이 불편할 터, 책보다는 가벼워 어디서도 읽을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할 것이라 짐작했다. 해서 신문을 준비한 것이다. 사설과 칼럼 두 꼭지를 읽었다. 그리고 관심 가는 모든 기사를 통독했다. 오후 4시. 이제 한 시간이 남았다. 이 정도는 견딜성 싶다. 신문지를 하복부 위에 올려놓고, 생각이란 걸 해본다.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는 사람이란, 어울림 없는 단독자를 뜻하는 것일까? 주위에 누가 있건 없건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닐까? 배우는 것, 곧 읽는 일은 쉽다. 남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일까지는 배움이나 읽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낱낱의 지식 쪼가리에 불과하다. 맞닥뜨린 문제해결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그 분석까지 된 지식을 질서 있게 처리, 곧 가공하여 체계화해서 축적해 둬야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지식 혹은 지혜가 된다. 이 일은 생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직 자신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힘, 혹은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나는 이 능력이 없기에 편안히 누워만 있어도 되는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다.
한계상황에서 자신의 진면목이 명확해진다. 돌아보면 제법 부품들을 많이 긁어모았다. 마는 조립하여 쓸모에 닿는 완성체를 일구지는 못했다. 한심한 인생인가? 하지만 자기비하(自己卑下)는 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건 부족한 걸 모르는 게 항상 문제일 뿐, 부족함을 아는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진전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조립하는 즐거운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 가슴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 않은가. -계속-
<작가/본지 편집위원, ouasaint@injuryti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