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이 있던 자리
이 병 순 소설가
얼마 전에 영화배우 강수연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났다.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이틀 뒤에 사망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황망한 소식이었다. 강수연은 아역시절부터 지금까지 영화나 티브이에서 줄곧 봐 왔기 때문에 그녀의 사망이 내 지인의 일처럼 충격이었다.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매 순간을 축제처럼 살자고 또 한 번 다졌다. 축제처럼 살되 홀가분하게! ‘홀가분하게’라는 말 앞에 ‘축제처럼’이라는 수식어를 넣었다. 그러잖아도 나는 홀가분해지려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버리는 중이었다. 그리하여 나도 박경리 소설가처럼 언젠가는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라는 지경에 이르고 싶다.
새 것이거나 멀쩡한 것들이라도 내게 필요 없으면 없앤다는 철칙부터 세웠다. 책은 20, 30권씩 여러 묶음을 해 재활용코너에 내놓았지만 또 묶을 게 나왔다. 도자기그릇세트와 머그잔, 블라우스와 등산잠바, 트렌치코트, 믹서기, 칼 세트, 헤어드라이어, 전기약탕기 등은 커다란 상자 여러 개에 착착 담았다. 티브이 홈쇼핑을 보거나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돌면서 충동으로 구입한 것들은 역시 쓰임새가 없었다. 깨지거나 뾰족한 것들은 에어 캡에 둘둘 싸서 박스 맨 아래부터 넣었다. 그렇게 테이핑 한 여러 박스들을 서울에 사는 동생한테 모두 보냈다. 알뜰한 동생이 내가 보낸 물건들을 요긴하게 쓸 것이라 믿었다.
살림도구들이야 택배로 보내면 되지만 책상은 어찌할 수가 없다. 그 책상은 내가 독립할 때 어머니가 집들이선물로 사 주셨다. 어머니는 독립하는 내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어 하셨고 나는 망설이지 않고 좋은 책상을 사달라고 했다. 김해에 있는 가구백화점까지 가서 고른 책상은 가로 180, 세로 90센티 가량이나 되어 방을 꽉 채웠다. 게다가 양쪽에 폭이 넓고 깊은 서랍이 두 칸씩 달려 있어 근사해 보이는 책상이었다. 내 집에 놀러오는 친구들은 하나 같이 책상에 입을 댔다. 와, 회장님 책상 같네. 나무질감도 정말 좋네. 여기서 공부하면 공부 잘 되겠다. 모두들 책상을 어루만지면서 한 마디씩 했다. 그런데 나는 그 책상 앞에 잘 앉지 않았다.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책상 밑에 넣으면 양쪽에 붙은 서랍이 뒤까지 불룩하게 튀어나와 다리를 마음대로 놀릴 수가 없었다. 목수인 둘째오빠한테 부탁해 서랍을 떼버리고 싶지만 서랍을 떼면 상판이 어그러지는 구조라 그러지도 못했다.
어머니가 마음먹고 크고 좋은 책상을 선물하셨는데 나는 선물을 애용하지 못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어느 날 둘째오빠 작업실에 갈 일이 있었다. 그때 오빠의 육송원목작업대를 보았다. 당연히 작업대는 오빠가 짠 것이었다. 나는 두꺼운 원목작업대를 책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 오빠한테 작업대 모양의 책상을 짜 달라고 부탁했다. 오빠가 짜준 원목 책상은 서랍 따위는 달려있지 않고 튼튼한 상판과 네 다리만 있는 모양이라 보기에도 깔끔했다. 상판 네 귀퉁이는 사개맞춤을 해서 틀어질 염려도 없었다. 두툼한 원목책상을 들여놓자 어머니가 사주신 책상은 더욱 뒷전으로 밀려났다. 나는 책을 읽고 신문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커피를 마실 때도 원목책상 앞에 앉았다. 어머니가 사주신 책상에는 선풍기나 가방 따위의 구지레한 물건들이 올려 져 있었다.
독립을 한 뒤 17년 동안 나는 지금까지 이사를 다섯 번 했으며 이사 때마다 어머니가 사 주신 책상을 끌고 다녔다.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쓰지 않을 줄 알지만 없애지 못한 것은 어머니가 내 첫 집들이선물로 사 주셨기 때문이었다. 방문을 쉬이 빠져나오지 않는 책상을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방문 틀에서 빼내느라 이삿짐센터 인부들도 애 많이 썼다. 방문 틀 모서리와 책상 모서리 하나 찍히지 않고 책상을 빼낸 인부들 솜씨도 보통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여덟 달 후면 또 이사해야 한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 공간부터 줄여야겠다는 생각은 벌써 하고 있었다. 앞으로 이사를 몇 번이나 더 해야 할 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게도 한 몸을 누이고 몸부림을 살짝 칠 수 있는 공간정도만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것만 남길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제는 눈을 질끈 감아야 했다. 어머니가 사주신 선물이라 하더라도 내게 필요 없으면 없애야 했다. 나는 넓적한 책상 면에 동호수를 기입한 용지를 테이프로 붙이고 서랍도 빠지지 않도록 테이핑처리를 했다. 가구를 옮길 때면 둘째오빠가 하던 대로 책상 밑에 이불을 깔고 밀었다. 묵직한 책상은 내가 미는 대로 밀려나갔다. 요리조리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가까스로 방 밖으로 책상을 빼냈다. 분리수거장까지 책상을 끌어낸 뒤 재활용수거센터에 전화를 했다. 담당자는 다음 날 책상을 수거하러 오겠다고 했다. 나는 수거업체에서 책상을 실어갈 때까지 몇 번이나 분리수거장으로 나가 책상을 보고 만졌다. 오랫동안 나를 따라 다녔던 책상이었다. 늘 큰방에 방치해둔 채 힐끗거리기만 했지 제대로 응대해주지도 않은 책상이었다. 담당자는 약속대로 책상을 수거해갔고 나는 업체의 요청대로 폐기처리비를 곧장 입금했다.
나는 책상이 놓였던 방문을 활짝 열고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책상이 있던 자리에 햇살이 가득 들어 와 있었지만 휑뎅그렁했다. 짙은 밤색의 반질반질한 책상 상판과 대리석기둥처럼 단단한 책상다리, 손만 닿으면 미끄러지듯 스르륵 열리던 책상서랍들이 삼삼했다. 엄마와 함께 가구백화점에 갔다가 책상을 고르고 나온 뒤 장유를 거쳐 그 언저리를 드라이버하고 오던 길에 쌈밥집에서 늦은 점심을 먹던 때도 떠올랐다. 니도 남한테 퍼주는 거 어지가히(어지간히) 좋아하는 데다 하는 짓도 내꺼 다 가가라, 하는 꼴이니. 다듬맞은(야무진) 구석이라고는 어느 구석에도 없고. 그래 사는 기 니한테는 좋은 기다. 아금다금 살아봤자 신상만 괴롭거든. 다 팔자대로 살게 되어 있는데 우짜겠노. 평소에 어머니가 내게 하시던 말씀까지 속속들이 떠올랐다.
“엄마, 다듬맞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엄마 딸래미, 다 가가라 하며 어설프게 사는 엄마 딸래미가 이번에는 엄마가 사 주신 책상을 없애뿠소. 웬만하면 내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려고 했지만 자리를 너무 차지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책상이 크기만 컸지 착 안기는 맛도 없고요. 나도 나이가 들면 집을 점점 줄여야 하고. 또 어차피 쓰지 않는 거 없애버리는 게 낫겠지요.”
나는 액자 속에 든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말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남색바탕에 연두색 땡땡이무늬가 있는 블라우스를 입고 벤치에 앉아 웃고 계셨다. 살아계실 때 나와 공원에 놀러갔다가 잠깐 벤치에 앉았을 때 찍어 드린 사진이다.
‘잘 없앴다. 안 쓰면 진작 버리지 와 그래 질게(길게) 갖고 있었노. 필요 없으면 없애뿌는 기 맞다. 책상이 암만 좋아도 포개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아이가. 잘 했다 고마. 니가 어련히 했을라고.’
어머니께서 벙글벙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데뷔작인 단편소설 「끌」에 ‘가구는 용적이 아니라 관계의 몸통’이라고 썼다. 언젠가는 비어질 그 자리를 먹먹함으로 바라볼 자신이 없다면 공간이 있다고 함부로 가구를 들여서는 안 된다는 투의 서술도 덧붙였다. 어머니 흔적을 없앴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내 마음에 살아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자꾸 그 빈자리에 눈이 간다. 커다란 방을 그득 차지했던 책상이었다. 오늘 따라 책상이 있던 자리에 햇살이 더 푸지게 들어 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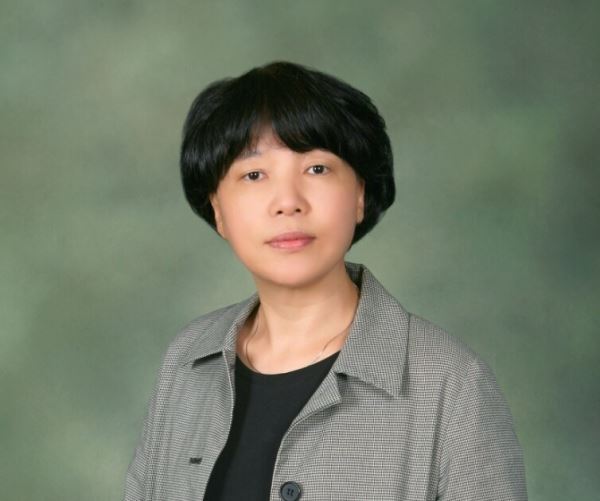 소설가 이병순
소설가 이병순
◇소설가 이병순
▷부산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끌」(2012년)로 등단
▷작품집 『끌』, 장편소설 「죽림한풍을 찾아서」 등
※(사)목요학술회가 발행하는 월간지 『시민시대』는 본지의 콘텐츠 제휴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