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좋은 걸 왜 남겨요? 다 드세요, 건강에 얼마나 좋은 건데.”
다슬기국을 반나마 남기고 숟가락을 놓자, 옆 테이블을 치우던 아줌마가 오지랖 넓게 충고를 건넨다. 건강에 좋다고? 다슬기국이? 대체 이 아줌마는 다슬기국이 건강에 좋음을 어떻게 알까? 또 그에게 건강이란 대체 뭘 의미할까? 하여튼 우리나라 장삼이사들은 직업을 막론하고 의사 뺨치는 건강 전문가다. 더욱 신기한 일은 ‘건강에 좋다’고 하면 대체로 누구랄 것도 없이 귀가 얇아진다는 것이다. 동행도 꾸역꾸역 국그릇을 비워냈다.
동네 앞의 들판을 지나면 강이 가로질러 흐른다. 이름하여 횡천강. 행정구역 이름인 횡천면도 이 강에서 연유한 듯하다. 가로지를 횡橫, 내 川. 냇물이 가로질러 흐르는 곳이 횡천면이다. 어렸을 적 물장구치고 놀 때, 이 냇물이 강인 줄은 몰랐다. 우리는 그 때 그냥 ‘큰 냇물’이라 불렀다.
‘큰 냇물’에 사나흘에 한 번 정도 ‘고동’을 잡으러(?) 간다. 오늘은 비가 와서 견딜 만 하지만, 맑은 날은 더위를 견뎌내는 데 에너지가 다 털린다. 노곤해진다. 극복 방법은 두 가지다. 모자 쓰고 땡볕을 무릅쓰고 자전거 페달을 밟아 이열치열하든지, 냇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다. 멱 감으며 놀기에는 시들해 할 나이이다. 노는 입에 염불하기라 했던가. 수경 쓰고 무자맥질하며 고동을 줍는 것이다.
우리의 ‘고동’은 다슬기를 지칭한다. 고동의 표준말은 고둥이다. 고둥은 소라나 우렁이 등 대개 말려있는 껍데기를 가진 조개의 총칭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 표준어인데, 횡천면에서는 교양이 있든 없든 남녀노소가 모두 고동이라고 했다. 전 국민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준어를 정한다. 표준어 사정 원칙에 의해 ‘고둥’으로 정해졌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없다. 문제는 왜 하필 다슬기를 고동이라고 불렀냐, 이다.
말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다. 말의 기본 단위는 우리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사물을 지시하는 단어이다. 단어의 수는 너무 적어도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만, 너무 많아도 기억하는 데 부담을 준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노력경제의 원칙’에 의해, 필요최소한의 단어만 쓴다.
 고동(다슬기) 잡는 풍경 [픽사베이]
고동(다슬기) 잡는 풍경 [픽사베이]
‘큰 냇물’에서 우리 생활에 유의미한, 혹은 먹을 수 있는 조개는 고둥뿐이다. 지시대상이 하나뿐이니 단어가 분화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 더 있긴 있다. 고랑이나 논에 서식하는, 냇물에 사는 것과 다른 고둥이 있다. ‘논고동’이라고 간단히 단어를 분화시켰다.
지금은 누구나 재첩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렸을 적 우리는 ‘갱조개’라고 했다. ‘갱-’은 ‘바다’라는 뜻의 사투리다. 민물에 대해 바닷물을 ‘갱물’이라고 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면 기억에 부담을 준다. 하여 기억하기 쉽게 단어를 만든다. 조개는 조갠데 바다 출신이니 ‘갱조개’라 한 것이다. 어렸을 적 ‘갱조개국’을 많이 먹어 지금도 그 맛을 입은 기억하고 있다. 지금 어떤 명품 재첩국도 이 맛에 미치지 못해, 식당에서 재첩국 사먹는 경우는 드물다.
부산에 살 때, 부산토박이들은 ‘게’를 ‘끼’라고 발음하는 경우를 자주 들었다. 부산에서 게는 흔한 해산물이다. 그들은 대체로 ‘ㅐ’와 ‘ㅔ’를 잘 구분하여 발음하지 못한다.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하면, 구별하여 들을 수도 없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개’와 ‘게’가 구분이 안 되니, 의사소통에 지장이 막대하다. 하여 멍멍이는 ‘개’라 부르든 ‘게’라 부르든 그대로 두고, ‘게’ 발음을 바꿔서 구분한 게 ‘끼’이다.
아마 다슬기는 조개가 여러 종류이어서 각 종류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방의 단어일 것이다. 표준어 사정원칙에 의해 다슬기가 표준어로 정해지자, 우리의 ‘고동’은 다슬기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다슬기국보다 고동국이 더 귓맛이 좋다.
이 고동국이 건강에 좋다고? 아마 그럴 것이다, 적어도 패스트 푸드는 아니니까. 그러나 그냥 한 끼 식사에 곁들인 국일 뿐이다. 위에 부담을 줄 정도로 우겨넣을 만큼 건강에 좋은 식품은 없다. 더구나 노력이나 땀 없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강은 없다. 우유를 받아먹은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법이다.
‘고동 열흘 가나, 피리 하루 가나’고 우리는 종종 말하곤 했다. 피리는 피라미의 사투리다. 고동의 굼뜸에서 연유한다. 그러므로 피라미는 날쌔니 잡아야 하지만, 고동은 이동이 미미해, 돌이나 강바닥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니, 줍는다는 게 더 사실에 부합한다. 20~30분 수경 쓰고 자맥질하며 강바닥을 훑노라면 두세 홉 고동을 줍는다. 더위도 가신다.
집으로 와서 상수도 물에 1~2시간 풀어놓는다. 그 시간 동안에 고동이 품고 있던 흙이나 해감을 토해낸다. 다음에는 소금을 먹인 물이 팔팔 끓을 때 고동을 털어 넣고 한 5분 더 열을 가한다. 불을 끄고 30분쯤 있다가 물을 따르면 파란 고동물이 되고, 고동의 내용물은 바늘이나 이쑤시개로 빼먹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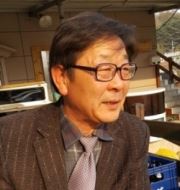 조송원 작가
조송원 작가
이 몇 시간의 행동들과 행복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리스트텔레스가 말하는 ‘행복’ 혹은 ‘행복하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삶이 무엇인지 그 전체의 방향을 잘 잡아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낮잠을 자버리거나 컴퓨터로 무료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는, 혹은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분명 방향을 잘 잡은 것이다. 그렇다고 이 시간을 쓸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건 아니다. 그냥 무덤덤할 뿐이다. 이 행동들이 행복을 기약하는 밑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실체가 없는 신기루일 뿐인가? <계속>
<작가/본지 편집위원, ouasaint@injuryti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