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당 달리의 유튜브 채널 [달리악당TV]에서 돈 드릴로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박선정 박사 [달리악당TV 캡처]](/Files/400/Images/202112/17521_22894_2058.jpg) 인문학당 달리의 유튜브 채널 [달리악당TV]에서 돈 드릴로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박선정 박사 [달리악당TV 캡처]
인문학당 달리의 유튜브 채널 [달리악당TV]에서 돈 드릴로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박선정 박사 [달리악당TV 캡처]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45초. 당시 구소련의 지배 하에 있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서 검은 연기와 푸른 불빛이 솟아올랐다. 이곳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중 4호기가 폭발한 것이다. 당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 엄청난 불길의 의미를 모른채 한밤중에 하늘을 뒤덮은 불꽃 구경을 위해 다리 위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년 안에 그들 모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지 35년이 된 현재까지도 체르노빌은 죽음의 땅으로 남아 있다.
돈 드릴로는 『언더월드』에서 주인공이자 쓰레기 업체 간부직원인 닉 쉐이를 이곳 체르노빌의 한 박물관으로 데려간다. 닉의 시선을 통해, 한때는 유럽의 대표적인 밀 곡창지대이기도 했던 아름다운 땅, 체르노빌이 인간에 의해 어떻게 ‘접근 금지의 땅’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과학 발전에 힘입어 인간과 세상을 더욱 편리하고 이롭게 할 것이라는 핵발전소가 어떻게 인간을 치명적인 위험 속에 빠뜨릴 수 있는가를 경고하고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경고는 2019년 HBO에서 5부작 시리즈로 제작 방영한 「체르노빌」(요한 렌크 감독)과 올해 개봉된 「체르노빌 1986」(다닐라 코즐로브스키 감독)에서도 다시 드러난다. 결국, 경제적 이윤을 위한 섣부른 판단과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 그리고 국가의 체면을 위한 은폐와 거짓말이 이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들 드라마와 영화가 방영되기 훨씬 이전인 1997년에 드릴로는 소설 『언더월드』를 통해 우리를 “지도에도 없는 아주 중요한 어딘가”에 위치한 ‘기형 박물관’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곳은 실제로 ‘체르노빌 박물관’의 한 전시관을 연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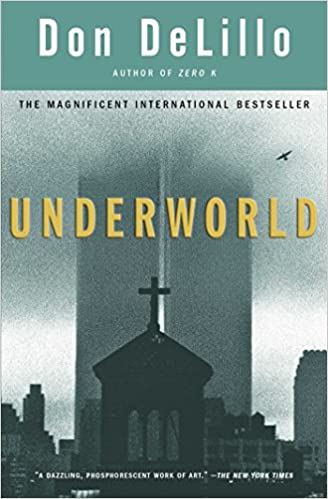 언더월드 표지
언더월드 표지
“그는 우리를 기형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데려간다. 태아들로 가득 찬 전시 항아리들이 길게 줄지어 있는 방 ... 그중 몇몇의 태아들은 하인츠 항아리 안에 보존되어 있다. 거기에는 머리가 둘 있는 것도 있다. 머리는 하나지만 크기가 몸의 두 배인 것도 있다. 정상적인 머리를 가졌지만 잘못된 곳에 자리를 잡은 것도 있는데 오른 쪽 어깨 위에 붙어 있는 것도 있다.”(799쪽 인용)
쓰레기로 이어가던 『언더월드』의 서사는 이 시점에서 ‘핵’으로 연결된다. 드릴로는 “인간이 만드는 모든 테크놀로지는 결국 폭탄에 귀착된다”고 밝히면서, 핵폭탄과 그것을 위한 기술적 실험과 은폐된 사실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여기에서의 ‘핵’은 ‘핵실험’과 ‘핵폭탄’,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 쓰레기인 ‘핵 폐기물’을 모두 포함한다.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중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연결고리의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 핵폭탄이고 핵발전이다. 나아가, ‘연쇄반응’이라 부르는 그들 간의 연결고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결과물, 즉 핵폭탄이나 핵발전소의 결과물들은 또다시 그것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시행한 다양한 사람들과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와 수많은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핵과 관련된 다양한 연결고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밀접하면서도 더욱 은밀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방사능’이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상황처럼, 이러한 방사능 역시, 마치 죽음의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은 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상태로,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면서” 현대인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
 영화 「체르노빌」의 한 장면
영화 「체르노빌」의 한 장면
구소련 시절 450여 차례의 핵실험이 진행되었던 카자흐스탄의 세미팔라틴스크 지역은 지금도 ‘죽음의 땅’이다. 그러나 더한 비극은 죽음의 신이 단지 그곳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곳에서 거의 200km나 떨어진 지역에서조차 현재까지도 엄청난 수의 기형아가 출생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발전소 반경 30km 이내 지역만이 거주 불능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0km는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지역이다. 그러기에 소설 속 카자흐스탄 피해 주민들은 ‘그것이 존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존재하는지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것은 실재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낸다. 소설에서처럼 ‘기형아’ 출생 및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질병을 통해 그 존재를 증명해 보인다.
드릴로는 핵폭탄 원료 중 하나인 ‘플루토늄’(Plutonium)의 이름이 지하세계 즉 죽음의 신인 ‘플루토’(Pluto)에서 유래한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우리가 파묻어버린 많은 것들이 거대한 지하세계를 만들었고, 이것은 죽음의 신인 플루토의 지배 아래 지상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엄청난 파괴력을 숨기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쓰레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사능 폐기물 역시 아무리 깊이 파묻고 거기에 시멘트를 퍼붓는다 해도 그것의 치명적인 영향은 반드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지하세계와 지상세계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더 깊이 묻어 버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박선정 박사
박선정 박사
이 시점에서 우리는 2011년에 이웃 국가인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 사고로 발생한 재앙이 여전히 해양생태계의 순환과 연계를 통해 이웃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건설되어 있는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러한 우려는 성장과 효율의 미명 아래 더욱 깊숙이 묻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드릴로의 『언더월드』와 요한 랜크의 「체르노빌」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왜 걱정하고 있나'라는 원자력에 대한 낙관적 사고에 대한 지극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경고로 해석된다.
<영문학 박사 / 인문학당 달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