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노이즈』는 세계적인 포스트모던 작가로 인정받는 돈 드릴로의 1985년 소설이다. ‘상편’에 이어 ‘하편’에서는 이 소설과 더불어 현대사회에서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인공 잭 글레드니는 네 번째 아내인 바베트와 함께 각자의 결혼에서 낳은 자녀들 넷을 함께 키우며 살고 있는 미국 소도시 작은 대학의 ‘히틀러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이다. 그가 슈퍼마켓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모습은 일상 속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의 삶에서 죽음은 늘 먼 타자의 것이었다.
그러나 평화롭던 잭과 그의 도시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다. 나이오딘 D라는 치명적인 물질을 실은 탱크차가 어딘가에 세게 부딪히면서 그 가스가 공중으로 유출되어 인근지역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는 ‘깃털구름’이라 불렸고, 그 다음에는 ‘검은 소용돌이구름’으로 고쳐 불리어지다가, 최종적으로는 ‘유독가스 공중유출 사건’으로 명명된다.
소설 속 이 사건은 처음에는 한 지역에만 한정된 사건으로 인식되거나 그러기를 바랐던 ‘우한바이러스’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공식적으로 ‘COVID-19'이라 명명되어진 최근의 실제 상황을 연상시킨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지역만의 일로 남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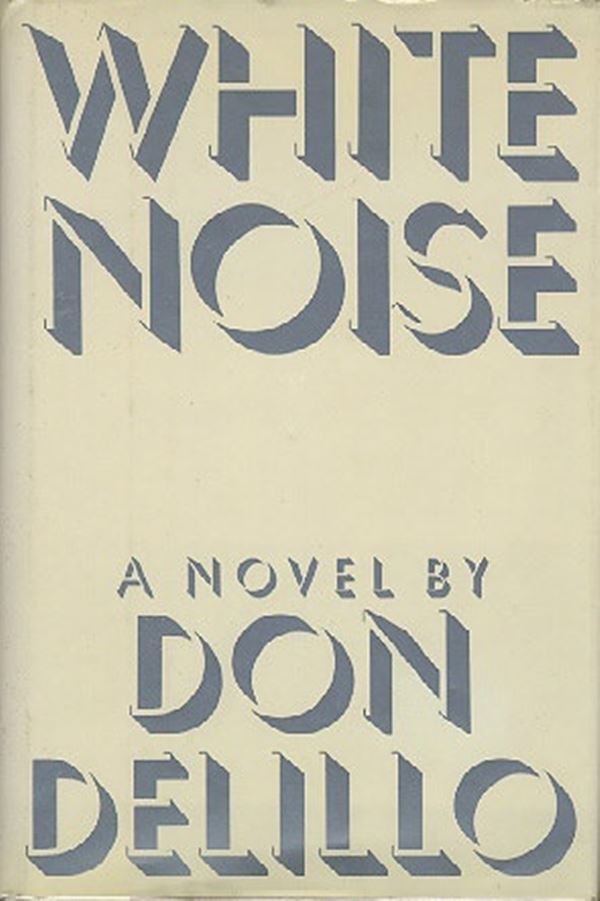 돈 드릴로의 '화이트 노이즈' 초판 표지 [Public domain]
돈 드릴로의 '화이트 노이즈' 초판 표지 [Public domain]
드릴로는 자신의 1998년 소설 『언더월드』(Underworld)에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Everything is connected.)라는 문장을 통해 이러한 전 인류의 공동체적 운명을 엄중하게 경고한 바 있다. 결코 인류는 ‘너와 나’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생명체라고 말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도 소설 속 가족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죽음과 공동체적 운명에 대한 인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목격할 수 있는데, 그러한 현대인들의 태도는 ‘죽음의 타자화’로 요약할 수 있겠다.
‘유독가스 공중유출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알려주는 인물은 잭의 십대 아들인 하인리히다. 말이 없고 조용하며 별다른 관심사가 없었던 아이였으나, 이번 사건이 “화끈한 자극”이 되면서 말수가 많아지고 오히려 신이 나서 떠든다. 끔찍한 사건 사고들 앞에서 말이 많아지고 오히려 생기를 찾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해 섬뜩하기조차 하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실제 사건 사고와 죽음이 일상에서 또 하나의 ‘이벤트’나 영화처럼 받아들여지는 모습들과 오버랩된다.
신이 난 아들과 함께 아버지 잭의 모습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오염된 공기가 자신들 쪽으로도 이동해오는 것을 염려하는 아들에게 그 유독가스가 “이쪽으로 오진 않을게다”라고 거듭거듭 단언한다. 죽음은 타자의 것이지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우리의 평범한 믿음이나 바람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전자기기의 발달과 더불어 현대사회에서의 죽음의 형상과 인식 또한 많이 달라졌다. 현대인들은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에서 그리고 다양한 전자매체들에서 시시각각으로 수많은 죽음을 접하지만, 그 죽음은 실재하고 있는 죽음과는 다르다. 우리는 매체를 통해 보여 지고 전해지는 그 죽음 역시 화면 속 또 하나의 흥밋거리로 인지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죽음 역시 또 하나의 시뮬라크라(가상현실)가 된 셈이다. 잭의 말처럼, “그건 저기 있고, 우린 여기 있쟎아”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과 타인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지지만, 그 죽음은 많은 경우에서 그저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몇 명이나 죽었대?’
영원히 타자의 몫이라 여겼던 그 죽음은 ‘내 것’이 되어서야 진짜 ‘죽음’으로 다가온다. 그 치명적인 가스가 절대로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는 실려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던 잭이 오히려 그 공기에 노출된 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고 시시각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이루어 놓은 과학기술들로 인해 인류는 “우리의 죽음에서 자신을 마치 이방인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죽음은 이미 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내부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매체에서 SNS에서 끊임없이 감염자와 발병자와 사망자가 보도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 죽음은 그저 타자의 일이고 단지 숫자일 뿐이며 내게는 결코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듯하다.
 돈 드릴로 [알라딘]
돈 드릴로 [알라딘]
이처럼 ‘죽음의 타자화’와 더불어, 잭이 오염 물질이나 병원균에 대한 감염과 죽음은 자신과 무관한 것이라 여기는 데는 또 다른 ‘근거’가 있다.
“이런 일은 노출된 지역에 사는 빈민들에게나 일어나는 법이야. 이 사회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자연재해나 인재의 주된 타격을 받도록 생겨먹었어. 저지대 사람들이 홍수피해를 받고, 판자촌 사람들이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에 당한단 말이야 ... 우린 고상한 이름을 가진 대학 근처의 말끔하고 쾌적한 마을에 살고 있어.”
“난 그냥 대학교수가 아냐. 학과장이라구. 유독가스 공중유출 사건으로 대피하는 내 모습은 상상할 수 없어. 그건 초라한 시골 마을의 이동식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나 일어날 법한 일이야.”(본문 인용)
 박선정 박사
박선정 박사
‘죽음’(질병)에도 차별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드러났는데, 감염시작지인 ‘우한’지역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하여 인종 간의 혐오와 지역적 차별로까지 이어진 다양한 실제 모습들이 그러했다. 많은 이들이 내심 이러한 감염과 집단적 죽음은 가난하거나 위생적으로 불결하거나 낙후된 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여겼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경제력이나 지위가 감염과 죽음으로부터의 방패가 되어 줄 거라 기대했다. ‘자신의 교수복을 입고 검은 안경을 쓰면’ 죽음마저도 비껴갈 것이라 바라던 주인공 잭처럼 말이다. 그 결과, ‘타자만의 죽음’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타자들과의 연결망 속에 있는 자신’을 망각한 행동들이 드러나면서 더 많은 실제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설 속에서와 같은 공기 오염의 팬데믹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겪어오면서 우리는, 나와는 무관한 죽음, 그리고 지위와 경제력으로 차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그 죽음이 그 기대와는 달리 어느새 내 곁에도 바짝 다가와 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죽음은 결코 타자화될 수도 차별되어 질 수도 없는 모든 인간의 운명임을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닐까.
결국, 타인의 죽음 앞에서 ‘나’의 운명을 예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운명 속 인류애를 되살리며 실제의 서로를 느끼고 바라보아야 할 때임을 절감한다. 이 글을 통해서나마 ‘COVID-19' 감염으로 죽어 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죽음 앞에서 아파해야 했던 가족 및 친구들과 마음을 함께 한다.
<영문학 박사 / 인문학당 달리 소장>